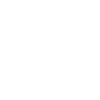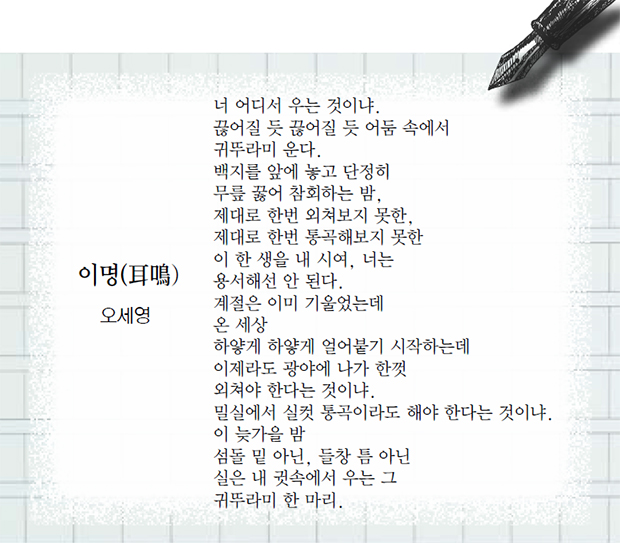
귀뚜라미 한마리가 운다.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겨울이 시작되기 전 귀뚜라미는 스스로의 몸을 비벼 소리를 내고, 듣는 이의 마음도 따라 비비게 한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베란다 쪽인 것 같지만 도대체 어디일까 하고 막연히 더듬다 말았다.
오세영 시인의 아름다운 시, <이명(耳鳴)>에서도 귀뚜라미가 운다. 시인이 소리를 따라가 착지하는 곳은 허름한 시간이다. 새하얀 종이 앞이다. 그리고 시인은 귀뚜라미 소리를 잉크 삼아 흠뻑 적신 내부를 밀어 올린다. ‘제대로 한번 외쳐보지 못한, 제대로 한번 통곡해보지 못한 이 한 생을’ 용서해선 안된다고 울부짖는다.
그래 울자. 나도 따라 울어야 살겠다. 울어서 이번 생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시 위에 골목길이 겹쳐진다. 골목길의 아우성은 세계를 얼어붙게 했다. 막다른 골목길이 아닌데도 오도 가도 못했던 청춘들을 되찾고 싶다. 이 땅에는 청춘의 열기와 청춘의 입김이 필요하다. 막힌 것과 텁텁한 것들은 열기로 녹이고, 말이 안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들을 입김으로 순환시키는 청춘의 바람이.
10월29일의 외침은 더이상 이명이 아니다. 그리고 10월29일은 허구한 날 중의 하루가 아니며, 어느 틈엔가 잊혀버리고 말 익명의 날일 수도 없다.
그래서 묻는다. 여전히 불안으로 꽉 막혀버린 이 골목길을 뚫을 자가 그 누구인지를. 그리고 밝힌다. 거창하게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단지 골목길에 대하여 묻는 것임을.
이병률 (시인)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