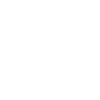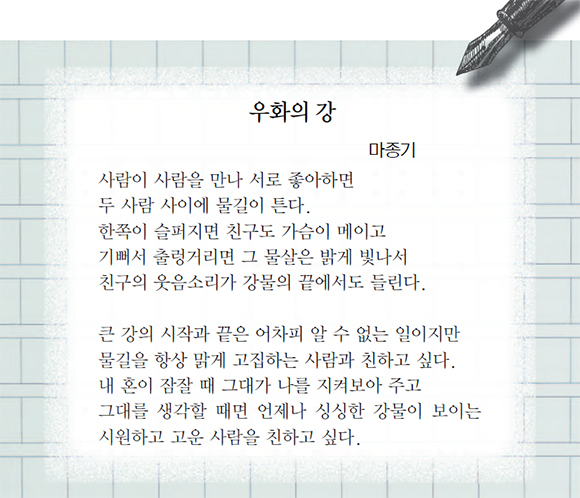
며칠 전 장사익 선생의 공연에 다녀왔다.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을 노래로 만든 곡을 부르는 공연이어서 마종기 시인과 함께한 자리였다.
<우화의 강>을 부를 때도 물론이려니와 장사익 선생이 부르는 노래들은 줄줄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마스크 위로 뚝 하고 떨어졌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인생을 곡진히 넘고도 넘는구나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이 스쳐서였는지 모르겠다.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던 마종기 시인도 그랬을까. 마종기 시인의 가슴에도 맺히는 그것이 나의 그것처럼 물길이 돼 흘렀을까.
마종기 시인에게 직접 시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는 나에게 시를 가르쳤다. 가슴에 품고 다니면 그처럼 시를 쓸까 싶었던 청춘의 날들은 마종기 시인의 존재를 지우고는 설명도 회고도 불가능하다. 그는 닿을 수 없는 멀디먼 타국에 살았다.
이 시의 쨍한 울림에서 느껴지듯이 마종기 시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길’에 대해 쓴다. 사람간의 희망과 가능성,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온기를 쓴다. 그의 시 세계를 관통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거나 깊디깊은 ‘사랑’ 같은 것이다. 그 물기들은 강을 낸다.
공연을 보고 돌아오는 캄캄한 길, 마종기 시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두캔을 사 갖고 나왔다. 나에게 마시겠느냐고 묻지도 않는 시인의 급한 행동은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길거리 의자에 앉아 달빛을 안주 삼아 맥주를 삼켰다.
시인도 공연을 보면서 나처럼 많이 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병률 (시인)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