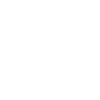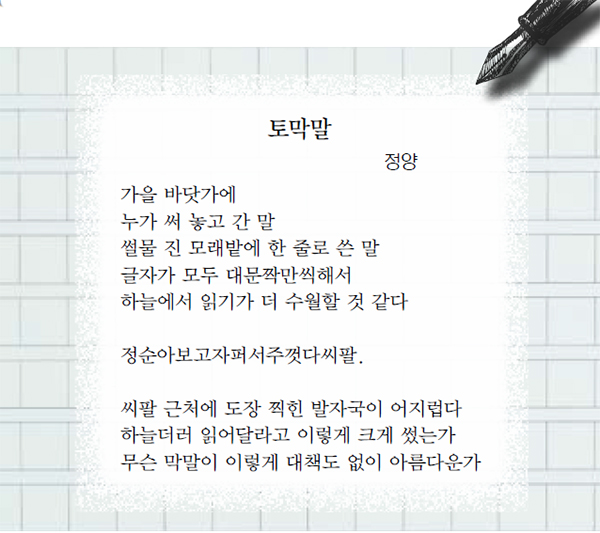
라디오 오프닝 멘트는 온통 날씨 이야기만 한다. 가을이 왔다는 이야기. 호젓이 가을을 맞고 싶지만 타인의 극성스러운 감각도 문득 고맙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을이라지 않는가.
요 며칠 가을이 오면 무얼 할까 생각했다. ‘무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라는 생각을 한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시인은 그렇게 살면서 몇줄을 건져 올리는지도 모른다. 찬란도 좋지만, 허무도 좋다. 포근함도 좋지만, 한기도 좋다.
정양 시인의 <토막말>이라는 시처럼 바닷가에서나 아니면 어느 단풍 드는 나무 밑에서 욕 한사발 부려놓으면 어떨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적어놓을까.
남프랑스의 도시 몽펠리에의 작은 공원을 걸을 때였다. 산책로 주변에 서 있는 큰 나무 한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나무 사이의 빈틈에 사람들이 꽤 많은 종이를 접어 꽂아둔 게 보여서였다. 이 나무가 독특한 사연이나 전설을 갖고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그냥 이 나무와 똑같이 생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을 뿐 특별한 표식이 보이지는 않았다.
누가 제일 먼저 이 나무에다 사연을 적어 꽂아뒀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정양 시인의 시 한줄처럼 ‘정순아보고자퍼서주껏다씨팔’ 같은 글귀가 꽂혀 있을지도 모른다.
공원에 사람이 없어 몰래 사연을 하나 펴보고 싶었지만 나도 괜스레 종이에 뭔가를 적을 것 같아 마음을 접고 돌아섰다.
“가을입니다. 가을이어서 보고 싶습니다.” 이 가을을 여는 나의 오프닝 멘트는 이렇다.
이병률 (시인)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