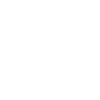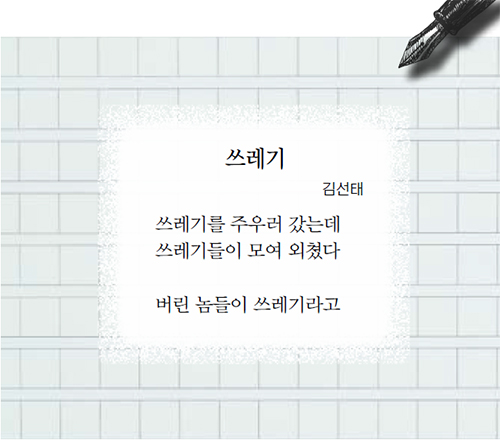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였다고 한다. 내가 태어나기 이태 전 일이다. 하지만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나의 유년기는 플라스틱과 무관했다.
바가지·소쿠리·함지박·돗자리·삼태기 따위 생필품은 모두 ‘뿔’ 이전이었다. 그 시절, 어른들은 플라스틱을 ‘뿔’이라고 불렀다. 뿔 바가지가 들어오자 원래 바가지는 ‘촌것’으로 전락했다.
1970년대 초반,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자 플라스틱의 점령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가볍고 튼튼하고 값싸다니! 플라스틱은 ‘신의 선물’처럼 보였다. 그사이에 사기그릇과 놋그릇이 밥상에서 사라졌다. 길거리에서 팔던 지우산(종이우산), 돼지고기를 둘둘 말아주던 신문지, 교과서 표지를 싸던 달력 따위가 다 없어졌다.
19세기 후반, 코끼리 상아로 만들던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 발명된 플라스틱은 채 100년도 안돼 전 인류의 일상생활 속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신의 선물은 오래가지 못했다. ‘악마의 저주’로 돌변하고 있다. 인류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존재다. 김선태 시인은 쓰레기들의 외침을 듣는다. “버린 놈들”, 즉 인간이 쓰레기라는 것이다. 문제는,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몸속으로 돌아온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 원인은 그동안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 또한 미래세대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상을 물려주려고 그토록 허리띠를 졸라맸단 말인가…. 아이들 눈을 바라보기가 힘들다.

이문재 (시인)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