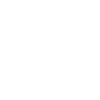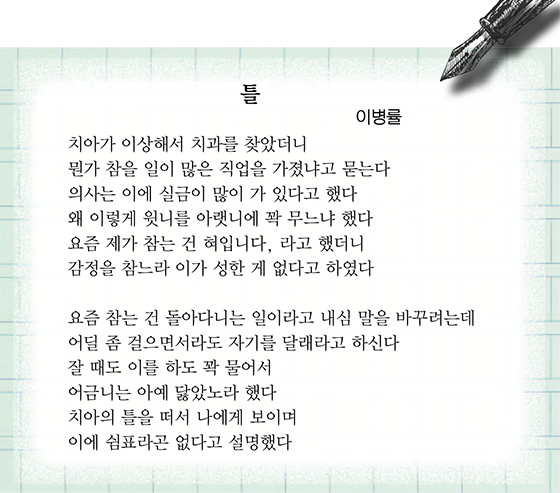
이사를 할 무렵에 쓴 시다. 이사를 하다보면 집을 보러 다녀야 하는데 그때 나는 세상의 내부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 싶을 정도로 씁쓸한 기분이 든다. 왜 아니겠는가. 남이 살고 있는 집에 불쑥 들어가 이것저것 보자면 무조건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내 눈을 찌르곤 하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들어가 살기로 했으나 이미 앞서 살던 사람은 여섯식구가 살았던 작은 집도 있었고, 모든 식구가 대구로 대전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집을 정리해야 하는 집도 있었다.
아이 둘이서 빈집을 지키다 한 아이는 비디오를 보다 지쳐 잠이 들고 한 아이는 밥솥에서 손가락으로 밥을 꺼내 먹던 음울한 풍경의 집도 떠오른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집은 빠른 집 처분을 위해 집 열쇠를 이웃집에 맡기거나 아예 복덕방 아저씨에게 건네주는 사람도 있었다.
막 보채다 잠든 아이 때문에 조심조심 집을 둘러봐달라는 새댁도 있었고, 머리를 감아서라며 수건을 두르고는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는 여자가 살던 집, 벗어놓은 신발이 많아서 문밖에다 신발을 벗어두고 남의 신발을 밟고 들어가야 했던 집, 집, 집. 나는 그 숱한 집들과의 인연을 통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집을 짓는 사람으로 태어나야겠다는 막연하지만 결연한 생각도 하게 됐다.
그리고 치과에서는 난데없이 ‘혹시 참는 직업을 가졌느냐’는 질문을 받으며 이를 뽑고 새 이를 달았지만 그게 과연 내가 살고 싶은 원하는 집이었는지… 나에게 조용히 질문하게 됐다. 엊그제 폭우로 길이 막혀 집에 돌아가서 쉬지 못한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

이병률 (시인)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