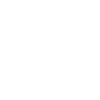작년 봄에 밭을 판 어르신
그 후론 고물상 다니지만
괭이 집에 두고오기 딱해
출근길에 꼭 가지고 다녀
그는 변함없이 ‘농부’였다

아침 출근길에 농부를 또 만났다. 그는 괭이를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앞서 걷는 중이었다. 차들이 쌩쌩 질주하는 도로는 메타세쿼이아 길이고, 그 옆에 나란한 이 길은 아는 사람만 다니는 옛길이다. 옛길에도 차도가 있지만 경운기나 전동휠체어가 주로 오간다.
길 위에 나 혼자일 때가 훨씬 많다. 그때는 파란 선으로 가둬놓은 좁은 인도가 아니라 넓은 차도로 걷기 일쑤다. 그런데 괭이를 든 저 농부가 앞서 인도로 걷고 있으면 나도 인도로 옮겨 그를 따른다.
농부가 챙긴 농기구는 괭이 한자루뿐이다. 괭이를 어깨에 척 걸친 채 느릿느릿 걸음을 뗀다. 새가 울어도 개가 짖어도 고개 돌리는 법이 없다. 길에서 일어날 법한 일은 다 아는 눈치다.
내 작업실이 농부의 밭보다 가까운 것은 분명하다. 언제나 농부보다 먼저 길에서 벗어났기에 밭을 본 적이 없다. 왼편에 있다면 농부는 파란 선을 넘어 차도를 건너갈 것이고, 오른편에 있다면 농부는 파란 선을 건드리지 않고 길 밖으로 나갈 것이다. 밭이 얼마나 크고, 기르는 농작물이 무엇이며, 하루에 몇번이나 괭이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괭이를 챙겨 오른쪽 어깨에 척 걸치고 출근했던 길로 퇴근한다는 것은 안다. 왜냐하면 벌써 다섯번이나 출근길에서 만난 농부의 오른쪽 어깨에 똑같은 괭이가 얹혀 있었다.
내 백팩에도 소설을 지을 때 필요한 노트북이 들어 있긴 하다. 그러나 나는 백팩 없이 노트북만 들고 다니진 않는다. 노트북을 꺼내 들더라도 그걸 농부처럼 어깨에 걸친 적은 없다. 그물을 어깨에 걸친 어부나 도끼를 어깨에 걸친 나무꾼 정도는 나서야 괭이를 어깨에 걸친 농부와 겨룰 만하다. 도구를 딱 하나만 가져가서 일하고 다시 집으로 되가져와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단순함이여!
오늘 나는 조금 빨리 걸음을 옮겼다. 인도로 따르다가 파란 선을 벗어난 후 종종걸음으로 농부의 왼 어깨를 지나쳤다. 살짝 고개 돌려 인사를 건넸다.
“아직은 걸을 만하네요.”
농부가 일흔살은 훌쩍 넘긴 눈주름을 보이며 받았다.
“여름에도 걷기 좋다우.”
옛길을 따라 나무 그늘이 있긴 해도 여름엔 자전거가 제격이다. 그런데 농부는 한여름에도 이 길을 걷나보다. 괭이를 어깨에 걸친 채 자전거를 타는 건 그답지 않다. 괭이와 괭이의 무게를 감당하는 어깨와 괭이를 옮기는 두 다리면 충분하다. 나는 이왕 얼굴을 봤으니 말 한마디를 더 얹었다.
“밭이 신기리 가까이에 있나보죠?”
농부는 제 어깨에 걸친 괭이를 슬쩍 보며 답했다.
“밭이 있긴 있었수, 오지리 쪽에.”
오지리는 이 길이 아니다. 농부가 덧붙였다.
“50년 동안 일군 밭인데, 작년 봄에 팔았수. 그 후론 고물상에 다니고. 이 길로 20분만 걸어가면 나오는데, 혹시 아우?”
나는 고개를 저은 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고물상으로 출근하는 길이라면, 괭이를 왜 늘 어깨에 걸치고 걸으십니까? 몇번 이렇게 가시는 걸 봤습니다.”
농부가 괭이를 시소처럼 흔들며 답했다.
“요놈을 요기에 걸치고 밭에 가는 게 습관이 들어서…. 요놈만 집에 두고 오기가 딱하기도 하고. 고물상에 갈 때 요놈 말고 뭘 어깨에 걸치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괭이를 어깨에 걸치고 걸으면 밭을 판 허전함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내게 하지 않았다. 녹이 전혀 없는 괭이의 날은 처음 밭에 나가듯 날카로웠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농부였다.
김탁환 (소설가)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