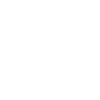예전엔 여행지 풍경이 담긴 기념엽서를 사서 ‘로마에서 주은’ 이런 식으로 서명한 후, 그 도시의 우표를 붙여 띄워 보내는 일이 운치 있는 일로 여겨졌다. 오래전 나도 유럽 배낭여행을 할 때 기차를 탈 때마다 엽서와 펜을 꺼내는 낭만을 즐겼다. 물론 제때 부칠 기회를 놓쳐 돌아오는 짐에 그대로 넣어 온 엽서들이 대다수였지만.
사이먼 가필드가 쓴 <투 더 레터>라는 책을 읽다가 엽서에 붙인 우표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다. 무릇 엽서란 내용이 전부 공개되는 형태라 은밀한 대화가 필요한 사람끼리는 우표의 기울기로 서로 약속해둔 메시지를 전하곤 했단다. 가령, 우표를 왼쪽 위에 거꾸로 붙이면 ‘당신을 사랑해’를 뜻했고, 그 자리에 직각으로 기울여 붙이면 ‘당신이 밉다’, 옆으로 눕혀 붙이면 ‘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였다고 한다. 오른편 위에 거꾸로 붙이면 ‘더는 연락하지 말자’라는 뜻이었다.
자연스럽게 게오르그 바젤리츠(1938년생)의 거꾸로 뒤집힌 그림들이 생각났다. 그의 그림은 볼 때마다 혹시 전시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걸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여 깜짝 놀란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던 프리즈(Frieze) 국제아트페어에 나온 <정오의 엑스레이> 앞을 지나칠 때도 그랬다. 추상화라면 위와 아래가 바뀌어도 ‘원래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가겠지만 인물화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사람은 머리가 위에 발이 아래에 있는 모습이 당연하기에 거꾸로 놓여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정오의 엑스레이> 역시 본래는 의자에 앉은 사람을 묘사했겠지만 우리 눈에는 철봉에 다리를 걸고 허술하게 매달린 모습처럼 보인다. 검은색 바탕 위에 흰색 물감으로 그려진 탓인지 죽은 이처럼 창백하고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화가는 거꾸로 된 그림을 선보이게 됐을까?
화가의 본명은 게오르그 케른으로 독일이 동과 서로 갈라져 있던 시절, 동독 작센의 도이치바젤리츠에서 태어났다. 열아홉에 미술을 공부하러 서독으로 옮겨가면서 케른은 지금 떠나면 고향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도무지 기약할 수 없었다. 고향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는지 그는 마을 이름 ‘바젤리츠’를 자기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다.
분단 상태였던 독일은 그림 경향도 서로 달라서 동독은 사실적이었던 반면 서독은 추상적인 경향이 강했다. 그림은 그림일 뿐인데 사람들의 눈은 그림을 향하지 않고 선입견에만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려는 듯 1969년부터 바젤리츠는 뒤집힌 형상을 보여줬다. 거꾸로 붙인 우표가 그저 실수가 아니었듯 거꾸로 그린 그림에는 담대한 전복의 의지와 도전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이주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