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의 新무궁화고] (9) 시대정신으로 만개한 ‘국화(國花)’, 무궁화
1919년, 3·1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일제는 문화통치를 내세우며 민족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언론·출판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했다. 민족의식을 일깨우려 했던 선각자들은 한글 신문과 잡지 창간을 해나갔다. 그 결과 일본의 규제와 감시·회유 속에서도 민족의식에 바탕 한 기사들이 쏟아지며 당대 시대정신을 추동했다. 언론은 사회 상황을 전하는 거울로서 무궁화가 국화(國花)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 이것이 민족정신을 헤아리는 존재로 부상한 무궁화의 활약을 이 시기 관련 기사를 통해 짚어보는 이유다.

국화(國花)로 자리매김한 무궁화
무궁화가 ‘국화’로 언급된 기록은 <개벽> 제46호(1924.4.1.)에 게재된 기행문 <호서잡감(湖西雜感)>에서 처음 나타난다. 월간잡지 <개벽>은 1920년 6월25일 창간된 이래 40회 이상 발행이 금지되는 상황에 처했으나 1926년 8월 강제 폐간될 때까지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사학자이자 언론인 차상찬은 이 잡지에 필명 ‘청오(靑吾)’를 쓰며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國花)다. 세계 희유의 식물이다. 자래로 조선을 근역(槿域)이니 근원(槿園)이니 하는 것도 이 무궁화가 있는 까닭이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런 내용은 무궁화가 국화로 인식된 시기를 특정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그는 <개벽> 제68호(1926.4.1.)에 실린 <화보(花譜)>에 “어느 나라던지 그 나라에는 반드시 그 국민성을 표징(表徵)하는 국화(國花)가 있다. 조선은 자래(自來)로 무궁화가 많은 고로 조선을 혹은 근역(槿域)이라고 하고 또 무궁화삼천리 운운의 국가(國歌)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무궁화를 우리 국민성의 표상으로 다시 한번 제시한 셈이다.
이외에도 <개벽>에는 폐간 전까지 ‘무궁화’가 언급된 글이 50여편 게재됐다. 또한 <개벽>의 창간정신을 이은 월간잡지 <별건곤> 제12·13호(1928.5.1.) 수록 김동혁의 논설 <화초동물 자랑-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조선산(朝鮮産)의 화초와 동물>에는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무궁화로 말하면 꽃으로는 개화기가 무궁하다 아니 할 수 없을 만치 참으로 장구하며 그 꽃의 형상의 엄연(儼然)하고 미려(美麗)하고 정조(情操)있고 결백(潔白)함은 실로 조선민족성을 그리어 내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우리 민족성을 반영한 무궁화가 한민족의 대표 꽃으로 손색이 없다는 그의 견해가 드러난다.
무궁화가 국화로 명기된 기록은 신문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동아일보> 1925년 10월21일자에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기사 <‘조선국화(朝鮮國花)’ 무궁화(無窮花)의 내력(來歷)>에는 “근화가 고래로 조선에 많았던 것은 사실이 증명하는 바”이며, “우리 조상은 이 조생석사(朝生夕死)하되 뒤가 잇는 근화를 무궁화라 하여 나라의 국화로 한듯합니다”라는 의견이 실렸다. 이 기사는 독자의 “대한시대에 국화(國花)를 무궁화로 숭상하엿섯스니 그 까닭이 무엇일가요”라는 질문을 인용하여 글을 전개함으로써 당시 국화로 인식된 무궁화의 일면을 가시화했다.
1935년 4월21일자 같은 신문 <세계 각국의 국화> 기사에는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을 무궁화의 꽃동산이라고 하야 근역(槿域)이라 부릅니다”라는 문장이 남아있다. 겨레의 대표 꽃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던 무궁화의 위상이 은연중에 표면화된 사례다.
해외에서 발간된 신문에서도 무궁화를 국화로 명기한 기록은 전해진다. 미주 한인 단체 대한인국민회에서 발간한 신문 <신한민보>(1936.10.29.)에 홍언이 기고한 칼럼 <가을 무궁화>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얏음이 … ”라는 문구가 나타남에 따라 교민들 사이에서도 국화로 인식된 무궁화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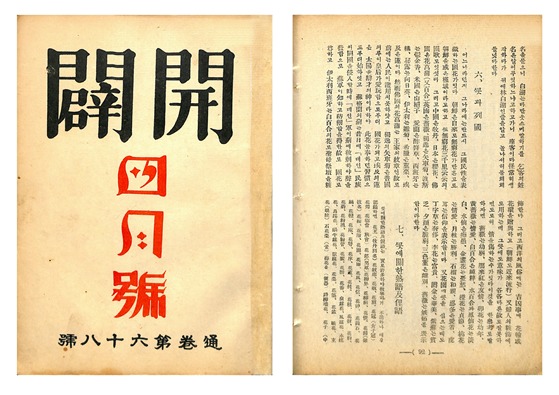
언론에 나타난, 국화 무궁화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
민족운동지를 표방한 종합잡지 <동광> 제7호(1926.11.1.)에 실린 국어학자 권덕규의 논설을 살펴보면 “조선에는 자래(自來) 무궁화가 많았다. 그리하여 근역(槿域)이라고까지 일컫는다. 꽃을 보고 누가 좋다 아니 하더냐”라는 문장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 ‘한글맞춤법통일안’ 원안을 작성한 국어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저자의 이러한 언급은 유구한 세월 한반도 일대에서 생장해 온 무궁화의 오랜 역사성을 시사한다.
그런가 하면 학자이면서 교육자였던 우호익은 <동광> 제13호(1927.5.1.)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 <무궁화고(無窮花考) 상(上)>에서 영국과 일본의 국화가 자국민에게 한없는 총애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조선 사람은 어떤 꽃을 사랑하였으며 우리의 국화(國花)로 숭배하였는가? … 이에 대하여는 삼척동자라도 ‘무궁화’라고 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학무부 차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원예학자 유자명은 <조선일보>에 게재(1927.6.10.)된 <광주(廣州)를 떠나면서>에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조선에 무궁화가 많았음으로 조선을 근역(槿域)이라 하고 따라서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한 것이라고 한다”는 문장을 남겼다. 무궁화의 유래를 ‘전설’로 표현하고 인용 형식으로 소개해 국화 무궁화의 유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던 정황을 암시했다.
역사학자의 정체성을 갖고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문일평의 경우, 기고 글 <무궁화와 군자인>(<조선일보>, 1930.2.20.)에서 “우리네 무궁화 같은 것은 참으로 이상적 국화(國花)가 될만하다”고 주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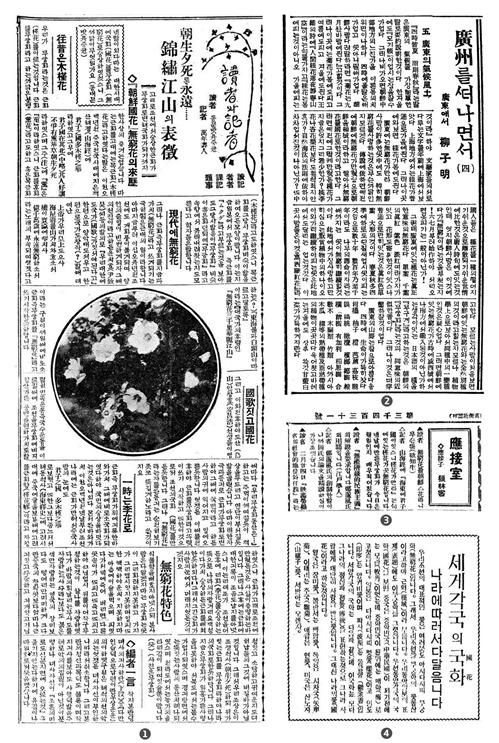
시대정신의 표상이 된 무궁화
‘국화’로서의 무궁화에 대한 기록은 1924년에 이르러 처음 나타났다. 3·1운동 이후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과 출판이 허용됨에 따라 민족의식 고양과 독립 열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고, 이런 언론 매체에 무궁화가 빈번히 언급되면서 급기야 국화로 명명한 기사까지 등장한 것이다. 언론이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화 무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 시기 비중 있게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경술국치로 나라를 강탈당한 이후 한민족은 한결같이 광복의 그날을 염원했다. 그리고 힘을 길러 독립을 이루려던 사람들의 당대 시대정신은 무궁화에 투영됐다. 독립운동가들에게 무궁화는 되찾아야 할 우리 국토였고, 독립군에게는 그리운 가족과 고향이 있는 해방된 고국의 상징이었다. 이 점은 해외동포들도 다르지 않았다. 무궁화가 독립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대신하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한편 언론 매체를 통해 ‘국화’가 언급된 저변에는 저항과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말 그대로 나라를 빼앗긴 시기였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나라꽃(국화)을 표방했다는 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되찾아야 할 나라가 있다는 점을 선언하는 매개로 무궁화를 채택함으로써 국가상징의 의미는 대중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은 흘러,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 밭에 심고 가꾸었던 우리 국화 무궁화는 지금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 강토에서 만개하고 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무궁화가 그들을 무궁토록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만 (신구대 미디어콘텐츠과 교수)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게시판 관리기준?
-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농민신문
-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